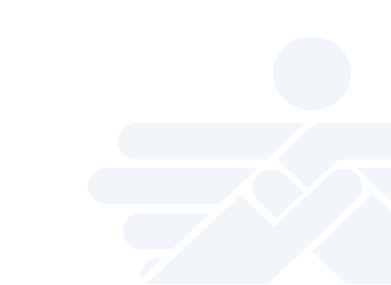정책연구원
[기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부지원법부터 제대로 마련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책연구원 작성일25-01-08 11:03 조회조회수 567회본문
[기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부지원법부터 제대로 마련하라!
유재길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전 국민건강보험노조 정책연구원 원장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와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에 따라,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부지원금의 역사는 1988년 농어촌 의료보험 확대를 위한 지역 재정 적자 보전에서 시작됐고,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2000년 지역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이 통합됐고, 2001년 의약분업 등 재정 위기로 2002년에 재정건전화특별법이 제정됐으며, 이 법에 따라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지역의료보험 재정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 법이 일몰된 이후 2007년 국민건강보험법에 5년 한시적 지원 규정이 신설돼,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정부 지원 기준으로 설정했다. 현재까지 세 차례 기간 연장을 통해 정부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 정부지원법이 5년마다 일몰이 정해져 있는 한시적 법이라는 것이다. 현재도 2027년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매번 100만인 서명운동 등을 벌이며 항구적 정부지원법을 촉구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 불안은 해결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정부지원금이 ‘예상보험료의 상당한 금액’으로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 정부가 이를 악용해 매년 지원금을 과소 지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지급하지 않은 국고 부담금은 지난 13년간 24조 원이 넘는다. 현재도 법정 지원 비율인 20%를 지급해야 함에도, 이명박 정부는 16.4%, 박근혜 정부는 15.3%,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각각 14%로 지원 비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 지원금이 불안정하면 건강보험은 예측 가능한 수입을 기반으로 한 지출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구조에 놓이게 되고 이는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을 어렵게 만든다.
더구나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마치 쌈짓돈처럼 빼먹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건강보험은 국민을 지키는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했다. 코로나 입원 치료비, PCR 검사, 신속 항원 검사, 예방 접종비, 의료 인력 지원비 등으로 수조 원을 지급했으며, 코로나19 시기 건강보험료 9,000억 원이 경감되는 일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응하면서 발생한 비용은 건강보험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감염병예방법 제67조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건강보험 지출은 계속 증가했다. 국회 토론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법정 감염병 진료비는 총 15조 6,000억 원에 달하며, 그중 12조 9,000억 원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됐고 나머지 2조 7,000억 원은 본인 부담금이었다.
또한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의료 대란 수습책으로 건강보험 재정으로 매달 1,882억 원+@ 금액을 대형 병원에 지원하고 있다. 필수의료 패키지로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10조 원 이상을 사용한다고 발표했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에 3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 원을 지원한다고 한다. 정부가 발표하는 각종 지원책에 조 단위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그동안 매년 수천억 원씩 흑자를 기록했다는 대형 병원들의 자구책은 보이지 않고 국민들이 적립해 놓은 건강보험 재정을 이렇듯 곶감 빼 먹듯이 사용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28년에는 건강보험 준비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 중 하나다. 2023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들의 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 의료비는 전체 의료비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 의료비 증가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은 앞으로 더욱 가중될 것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보험 제도의 강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
30년 넘게 건강보험 분야에 종사해 온 필자로서는 국민의 중요한 사회안전망인 건강보험 제도가 지속 가능할지에 대해 매우 염려스럽다. ‘문재인 케어’로 인해 진료비가 폭증해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는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재난 덕분에 국민이 병원을 가지 않아 일시적으로 해결됐다. 그러나 의료 대란, 감염병, 경제 위기 등 외부적 요인이 없었더라면 지금쯤 건강보험 재정은 이미 심각한 위기를 맞았을 것이다.
건강보험 제도는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으로, 국민연금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중 건강보험 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진료비 지불제도 개혁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필자는 이전에 진료비 지불제도 개혁에 대해 다뤘고, 이번에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원법부터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에 따르면, 한시적 일몰제를 폐지하고 예상보험료가 아닌 결산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계산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건강보험료 수입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의 개혁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 누구나 아프면 진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는 제도다. 건강보험 제도의 붕괴는 사회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 법안으로 발의된 정부지원금의 항구적 법제화,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 관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달성하려면 정부와 국회는 본연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길 촉구한다.
출처 : 참여와혁신(https://www.laborplus.co.kr)
댓글목록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